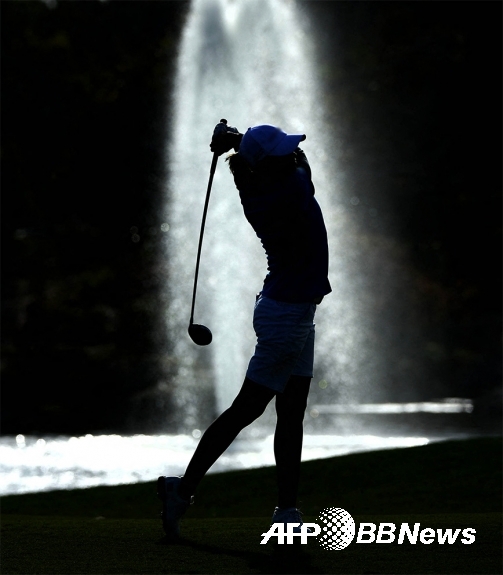
- ▲사진은 칼럼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제공=ⓒAFPBBNews = News1
[골프한국] 한번 골프의 마력에 걸리고 나면 웬만해선 벗어나기 힘들다. 운동에 소질이 있든 없든 골프채를 잡고 나면 평생 놓고 싶지 않은 게 골프다.
드물게 운동에 소질이 많은데도 골프에 매력을 못 느끼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그다지 운동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뜻대로 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를 그냥 스포츠의 하나로 치부해버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12세기 무렵 스코틀랜드에서 발원한 골프가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로 자리잡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자연 속에서, 스스로 심판이 되어, 자신만의 경기를 해야 하는 골프의 매력을 논하라면 몇 날 밤을 지새워도 모자랄 것이다.
“골프의 가장 큰 결점은 그것이 너무도 재미나다는 데 있다. 골프에 대한 그칠 줄 모르는 흥미는 남편으로 하여금 가정, 일, 아내, 그리고 아이들까지 잊게 한다.”(헨리 롱허스트)
“골프란 아주 작은 볼을, 아주 작은 구멍에, 아주 부적합한 채로 쳐 넣는 게임이다.”(윈스턴 처칠)
“골프는 남녀노소를 막론한 만인의 게임이다. 걸을 수 있고 빗자루질을 할 힘만 있으면 된다.”
“골프코스는 머물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지나가야 할 덧없는 세상살이 모든 것의 요약이다.”(장 지라두)
“인간의 지혜로 발명한 놀이 중에 골프만큼 건강과 보양, 상쾌함과 흥분,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즐거움을 주는 것도 없다.” (아더 발포어)
“골프를 단순한 오락으로 여기는 사람에겐 골프는 끝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는다.” ( G.H. 테일러)
골프의 불가사의성을 보여주는 금언들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흘린 땀에 비례하지 않는 결과, 아침에 깨달았다가도 저녁이면 잊는 속성, 언제라도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는 예측 불허성, 결코 신체조건이나 체력으로 변별되지 않는 결과, 마약보다 심한 중독성, 인생보다 더 인생다운 라운드, 신기루처럼 달아나는 목표 등 대충 나열해 봐도 쉬이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골프채를 잡은 뒤 좀처럼 골프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뜻대로 되지 않음’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철학적으로 고급스럽게 말해 ‘불가사의’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다.

- ▲사진=골프한국
최근 이 골프 불가사의의 또 다른 면과 접했다.
동네 골프연습장에 가끔 나오는 지인의 친구 얘기다.
같은 아파트단지 살며 친하게 되어 대학의 인문학 강좌도 함께 수강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지인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아무래도 갱년기 증상이 심한가 봐. 남편은 사업하느라 밖으로만 나돌지 나 혼자 보람 찾으러 에어로빅 수영 등 이것저것 해보지만 흥이 안 나. 앞으로 이렇게 살 일 생각하면 아찔해. 남들이 남편보다 연상으로 보는 데 정말 짜증 나. 남편은 밖에서 즐겁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27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정도야.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할까 봐.”
이 말을 들은 구력 30년이 넘는 지인이 조심스럽게 “골프 해보는 게 어때?”하고 제안했다.
“나 운동에 소질 없는 거 알잖아? 그깟 골프 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친구의 반응은 심드렁했다.
“에어로빅이나 수영 다니는 대신 골프를 한 번 해봐. 한 달 정도 해보고 적성에 안 맞으면 그때 그만두면 되잖아. 내가 권해줄 수 있는 것은 골프 외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지인은 자신이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골프를 하고 난 뒤의 여러 변화 등을 친절하게 들려주었다.
그제야 친구는 “그럼 한번 시작은 해볼게”하고 대답했다.
친구의 대답에도 지인은 60이 되어 골프를 시작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솔직히 기대하지도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 친구는 동네 연습장에 등록, 레슨프로로부터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그것도 매우 열성적으로.
스윙을 익히기 위해 식사 준비할 때 국자건 주걱이건 손에 잡히기만 하면 스윙 동작을 했다. 빗자루나 우산을 들고도 연습했다.
어느 날 이런 모습을 남편에게 들켰다.
“당신 요즘 뭐 하는 거야.”
친구는 남편에게 이실직고했다.
그러자 남편 왈 “그러는 게 어디 있어. 당신 혼자 골프 배우려고 했어? 나는 어쩌고? 같이 배우면 좋겠네.”

- ▲사진=골프한국
그래서 남편도 뒤늦게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친구는 몇 달 후 머리 올리고 난 뒤 골프에 미치기 시작했다. 길게 치지는 못 하지만 또박또박 잘 쳤다. 스코어에 구애받지 않고 치며 골프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그러기를 10여 년이 지났다.
아이언샷이 멀리 나가지 않아 하이브리드나 우드를 많이 연습했다. 지인의 말로는 ‘달인의 경지’라고 했다. 그래서 주위로부터 ‘우드 마담’이란 별명을 듣는다.
요즘 친구 부부의 캘린더는 골프 약속으로 빼곡하다고 했다. 여자는 한 달에 9번 내외, 남편은 6번 내외라니 난형난제다. 라운드 요청이 오면 콩나물 다듬다가도 달려나간다는 주의다.
“그때 골프 안 배웠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
지인을 만나면 고마워하며 털어놓는 얘기란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말끔히 씻어내고 삶의 재미를 되찾게 해준 이 케이스는 불가사의란 말 외엔 설명하기 어렵다.
→추천 기사: 64타 맹추격 김시우, 연장 끝에 아쉬운 준우승 [PGA 윈덤 챔피언십]
→추천 기사: 이정은6, 스코틀랜드 여자오픈 7위…9언더파 몰아친 리디아고 준우승 [LPGA]
*칼럼니스트 방민준: 서울대에서 국문학을 전공했고, 한국일보에 입사해 30여 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30대 후반 골프와 조우, 밀림 같은 골프의 무궁무진한 세계를 탐험하며 다양한 골프 책을 집필했다. 그에게 골프와 얽힌 세월은 구도의 길이자 인생을 관통하는 철학을 찾는 항해로 인식된다. →'방민준의 골프세상' 바로가기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의견으로 골프한국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골프한국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길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news@golfhankook.com)로 문의 바랍니다. / 골프한국 www.golfhankook.com


